어머나/정 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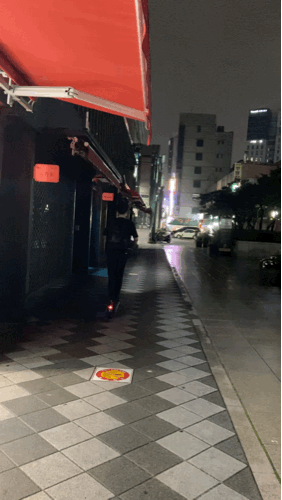
오래간만에 창밖을 내다봤다. 적요한 가운데 가만히 귀 기울여 봤다. 간혹 들리던 개구리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새벽 세 시경에는 얘네들이 자는 시즌과 타임인 걸까? 유월하고 십일일 경, 이 때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겠지만 서도.
도로 아래를 한번 뚫어져라 쳐다봤다. 혹여 이 시간에 지나는 사람이라도 있을까, 싶었다. 마침 딱 한 사람이 도보를 걷고 있었다. 계속 지켜보니까, 우리 아파트 정문 쪽으로 향하는 게 아닌가? 동민이라는 생각에 계속 그 사람을 내려다 봤다. 나무들이 서 있는 곳에서 좌측으로 곡선을 그으며 걸어오면 바로 아파트로 들어가는 게이트에 당도할 거였다.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일 분이 지나가는데도 그 나무들에 가려진 곳에서 자취가 보이질 않았다. 자연 내 눈을 의심해 볼 지경이었다. '뭐야, 정말?' 하면서 제아무리 십팔 층 창가에서 발을 세우고 쳐다본다고 해도 그 나뭇잎이 울창한 그 앞이 보일 리는 만무했다.
그래서 나의 시야를 확대해서 거리를 살폈다. 개 한 마리 지나가지 않았다. '뭐지?'라는 의문과 함께 별 이변이 없어 보이자, 괜스레 맥이 빠지는 감이 없지 않았다. 그래도 오래간만에 내다본 창가에서 호기심이 일어 한 사람 발견했는데, 한 마디로 바로 눈앞에서 사라진 거나 다름이 없었으니까.
잠시 따분한 김에 구름 하나 보이지 않는 까만 하늘을 쳐다봤을 때였다.
순식간에 전동 킥보드가 잎이 무성한 나무에서 튕겨져 나오듯 재빠르게 차도를 대각선으로 가르며 스무스하게 굴러가는 거였다. 바람 같았다. 아마도 그 자리에 전동 킥보드가 놓여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렇잖아도, 요즘 가다 보면 자주 띄는 것이 전동 킥보드였다. 새벽에 걸어가다가 무심코 놓여 있는 이 물건이야말로 새벽길 가던 그에게는 구세주였던 것일까?
무사히 도착하는 곳까지 잘 당도하길...
그런데, 왜 보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상상의 한계였다고나 할까?
전동 킥 보드를 타기 위해 잠시 나무 있는 아래서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는 것은 정말 뜻밖이었으니까.
오늘 새벽에 며칠 건너뛴 창밖을 내다보는 버릇이 생각나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내다본 거리는 그렇게 적막한 가운데 전동 킥보드 한 대 만이 조금 전만 해도 길을 걸어가던 사람의 눈에 띄어 굴러가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 이 새벽에 그 사람은 어디 갔다 오는 걸까? 아니 어디를 가는 걸까?
여전히 오지랖이 넓은 나에게, 스스로 적당히 하라고 타일러 보는 시간, 벌써 세 시 오십일 분이다. 나의 금쪽같은 시간이다. 오늘도 너무 고마운 시간인데 할애해 줘서 고맙구나. 또 보자, 나의 새벽 시간아. 안녕!
'하루, 오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글쓰기/정 열 (0) | 2022.07.02 |
|---|---|
| 웹 소설/알바천국은 있었다/이도은 (0) | 2022.06.13 |
| 집에 온 기분/정 열 (0) | 2022.06.11 |
| 도대체/정 열 (0) | 2022.06.07 |
| 잠/정 열 (0) | 2022.06.03 |



